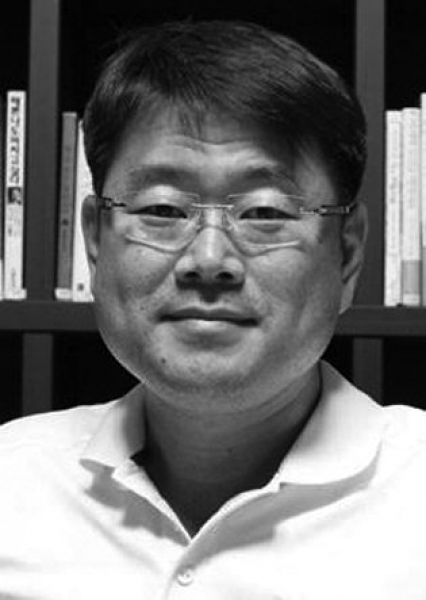 수학여행 떠난 아이들, 길 떠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수학여행 떠난 아이들, 길 떠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래, 우린 서로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엄마! 수학여행, 나 용돈…." 길지도 않은 몇 마디의 말.
몇 마디도 나누지 못했다.
애비는 먹고 산다고 생활고를 탓하면서, 이 시간이 지나면, '사랑해'라는 말을 마음 놓고 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루 그리고 또 하루를 미뤄왔다.
어미는 네가 공부에 방해될까봐 꼭 부둥켜안는 것도 아꼈다.
차디찬 어둠 속에 캄캄한 추위에, 저렇게 너를 홀로 둘 줄 알았다면 조금 잠시만이라도 더 너를 품어야 했는데….
네가 있는 저 바다 보이는 이 자리를 차마 서러워 떠나지 못한다.
4월16일 우리 아이들이 세월호를 타고 수학여행을 가던 날.
그 날은 처절히 가슴 시리도록 아픈 잔인한 날이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좌절의 시간이다.
결코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바로 그날은 영국시인 엘리어트가 노래한 <황무지> 서문과도 같다.
'한 번은 쿠마에서 나도 그 무녀가 조롱 속에 매달려 있는 것을 직접 보았다. 애들이 "무녀야 넌 뭘 원하니?"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대답했다. "죽고 싶어."
영원한 삶을 원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쿠마 무녀.
어린 생명을 팽개치고 나온 그들에게서 무녀의 모습을 발견하는 안타까운 날이었다.
하지만 겨울의 냉혹함에서 따뜻함을 발견하고, 불모의 땅에서 라일락꽃을 피게 하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어 봄비로 잠든 뿌리를 깨어나게 하라는 시인의 울부짖음이 들린다.
오열로 쓰러지는 어미를 위로라도 하듯 세상 곳곳에서 잔잔히 타오르는 촛불의 행렬은 여행을 떠난 우리 아이들의 몸짓인 듯 점점 번져나간다.
그런 아쉬움에 만약 우리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떠난 그 날이 다시 돌아온다면, 그 길을 반드시 보내야만 한다면 꼭 껴안고 싶다.
/손용석 농협중앙회 창녕교육원교수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